펜은 칼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인지 기자라는 직업을 마주하게 되면 왠지 모를 껄끄러움이나 어려움이 앞서게 마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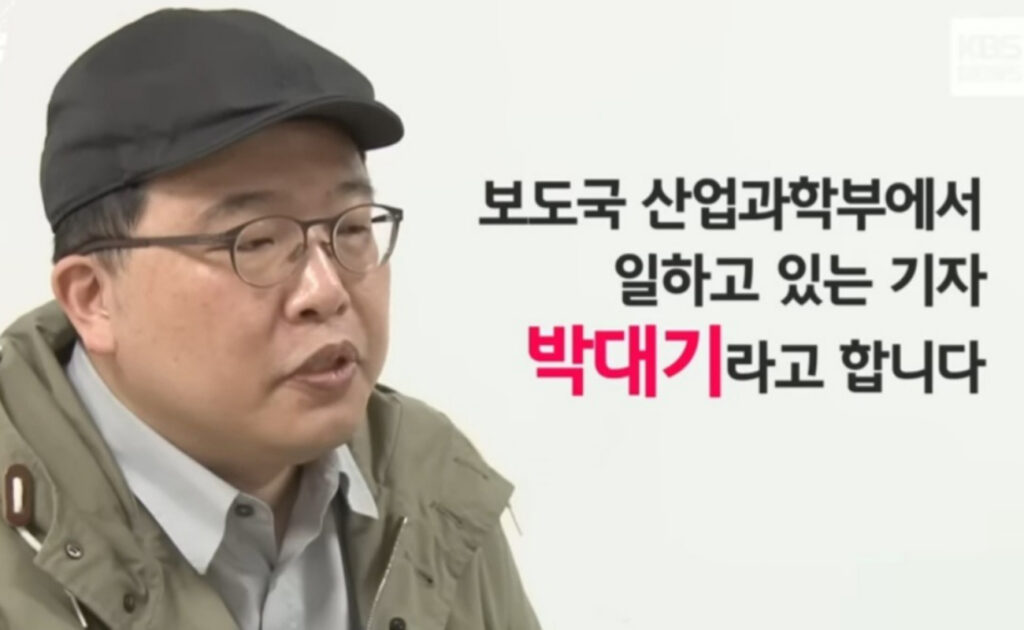
이렇게 기자라는 직업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유쾌함이나 즐거움보다는 다소 무거운 느낌이 더 강한데요.
오히려 말과 글로 먹고사는 사람들인 만큼 더욱 유쾌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기자들이 은근히 보여주는 재치 때문에 큰 화제를 모은 바 있는데요. 화제가 된 기자들은 다른 곳도 아닌 공영방송국인 KBS 소속의 기자들이라 더욱 주목을 받았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기사 내용이 아닌 기자들이 화제를 모았는지 궁금했는데요.

사람들의 관심과 웃음을 이끌어낸 것은 바로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였습니다.
뉴스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요. 각 기사들을 다루는 기자가 화면에 잡히게 되면 그의 이름과 함께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가 띄워져 있습니다.
업무용 이메일 주소인 만큼 굳이 시청자들이 관심있게 들여다볼 일은 많지 않은데요. 그렇지만 이 주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자들의 재치를 확인할 수 있죠.
이번에는 두 명의 기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가 여러 커뮤니티에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화제의 주인공들의 이름은 각각 김옥천 기자와 정해주 기자였습니다.

이름만 보면 평범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렇지만 김옥천 기자의 이메일은 ‘hub@kbs.co.kr’, 정해주 기자의 이메일은 ‘seyo@kbs.co.kr’이었죠.
이를 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빵 터지고 말았는데요.
‘옥천 허브’는 한 번 택배가 들어가면 배송지연이나 분실 위험이 높기로 유명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활용해 재치있게 주소를 만든거죠.
정해주 기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이어붙이면 ‘정해주세요’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KBS 기자들의 센스있는 이메일 주소는 이전에도 여러번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거 유명세를 치렀던 주소들 외에 이번에 새로 신입들이 만든 주소가 계보를 이은 셈입니다.
정해주 기자와 김옥천 기자 덕분에 과거에 화제를 모았던 다른 이메일 주소들도 재조명을 받았는데요.
‘병맛 메일주소’의 시작을 알린 사람은 KBS의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폭설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야외촬영을 진행하다 눈에 거의 파묻힐 뻔한 모습으로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뒤늦게 이런 기자정신을 발휘한 그의 이메일 주소가 ‘waiting@kbs.co.kr’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자신의 이름인 대기를 따서 ‘대기중’이라는 의미를 만든 셈이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청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알고보니 KBS 기자들 모두가 굉장히 유쾌한 자신만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박찬 ‘coldpark@kbs.co.kr’, 안혜리 ‘potter@kbs.co.kr’, 최선중 ‘best-ing@kbs.co.kr’ 등을 찾아볼 수 있었죠.
웃음을 자아내는 이메일 주소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요. 신선민(freshmin), 김범주(category), 이효용(utility) 처럼 영어단어를 직영하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초등학교를 다닐 때처럼 이름을 가지고 유치하게 만든 이메일 주소였는데요.
모든 기자들이 이런 주소를 뽐내면서 항간에 루머가 돌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 이름을 보고 유치히고 웃긴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주는게 전통이라는 루머였죠.
그럴싸한 말이었던지라 한동안 이 소문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렇지만 이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문의 진상을 밝힌 사람은 바로 KBS 기자 메일 대란을 만든 장본인인 박대기 기자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선배가 아이디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죠.
그의 말에 따르면 기자들 본인들이 메일 주소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노출되는 몇 초 안에 제대로 각인될만한 아이디를 고민하다보니 이런 전통이 생겨났다고 하네요.
심지어 면접 때 미리 이메일 주소를 정해왔다면서 밝히는 지원자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제보자들이 메일 주소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단어를 고안해낸게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 기자들의 색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화제가 된 게 아닌가 싶네요.